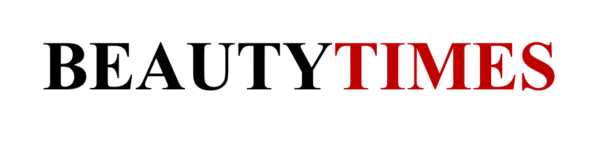깊이 파인 왕 주름살, 서럽게 피워버린 백발, 어머님을 뵈온듯한 온화한 여인들의 자태, 그 옛날 고향 어르신을 닮은 묵직한 얼굴…. 70줄이 되어버린 초등 동창생들의 모습이다. 순식간에 지나버린 먼 세월의 흔적 앞에서 난 고개를 숙였다.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간간이 몇몇 친구들을 만나기는 했지만,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친구들을 대면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겉모습은 영감, 할멈인데 마음만은 초등생들이다. 우린 그 시절로 돌아가 서로를 마음껏 즐겼다.
전라도 시골 촌놈들이다. 난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초등시절을 넘겼었다. 친구들은 대부분 빈농의 자식들이다. 힘겹게 학교를 다녔다. 하지만 우리는 유쾌한 기억들만 더듬었다. 순수하고 행복했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여행은 즐거웠다. 마치 어제의 일 같다. 선생님으로부터 매를 맞으며 공부했던 추억, 교실에서 벌을 받다 오줌을 싸버린 얘기에서부터 초로의 나이에 아깝게 세상을 떠나버린 여러 친구들의 모습도 떠올렸다.
서울과 고향 쪽에 사는 친구들이 삼삼오오 동행, 고창 선운사에서 만났던 것이다. 오고 가면서 차 안에서 나눈 추억의 대화도 별미였다. 선운사 절경, 유난히도 붉은 상사화(相思花)가 그림처럼 산야를 덮고 있었다. 꽃이 먼저 피고, 그 꽃이 진후에야 잎이 핀단다. 꽃과 잎은 결코 만날 수가 없단다. 그래서 상사병이 든 연인 같은 꽃 얘기가 분위기를 한층 더 돋구어 주었다. 산자락 주점에서 파전과 함께 들이킨 한 잔의 막걸리도 기가 막혔다.
우린 팬션의 큼직한 온돌방 두 개를 빌렸다. 어린 시절 소꿉장난을 회상하며 저녁도 함께 지어서 먹었다. 여자 동창생들의 요리솜씨는 일품이었다. 저녁상 얘기꽃은 밤새 이어졌다. 나에게 이처럼 감미로운 밤이 있었던가 싶었다. 우리는 서로가 튼튼한 보험이라면서 모두가 화롯불이 되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인생을 따뜻하게 보내자는 간절한 마음도 한 데 모았다.
여자동창생들은 여자동창들끼리, 남자동창들은 남자동창들끼리 두개의 방에 나누어 잠을 잤다. 코고는 소리를 들으면서 한 방에서 떼지어 잠을 자본 것은 군대시절 이후 처음이다. 새벽잠들이 없었다. 노인들이다. 그럼에도 노인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었다. 오늘의 노인세대의 모습이다. 아침도 지어먹으며 또 다시 얘기꽃을 피웠다. 엄청난 추억거리들이 또 쏟아져 나왔다. 사회 친구나 옛 직장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와는 아주 아주 달랐다. 은근히 자기를 과시하려는 잔머리를 굴리지 않는다. 뭘 자랑하려 하지도 않는다. 어제 일처럼 생생한 옛 얘기들이 향수를 자극한다. 신기하다. 세월이 흘렀어도 어린 시절의 성격은 그대로다. 목소리와 말하는 품세도 그렇다.
아침을 먹고 인근에 위치한 서정주 시인의 생가를 방문, 기념사진도 찍었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리던 / 머언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서 시인의 대표적인 시 <국화 옆에서..>가 소년, 소녀 시절 우리들끼리 가졌을 법한 애틋한 연정을 터치했다. 우리는 한참이나 벽에 새겨놓은 4편의 위대한 시들을 감상하며 어린 시절 순수했던 우정을 더듬었다.
초등친구들은 언제 만나도 부담스럽지 않다. 자기 자랑을 조금 해도 밉지 않다. 잘 나고 못 나고를 떠나 마음이 편하다.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즐기는 나의 몇 안 되는 스케줄이다. 이제는 친구들이 살아온 하나하나의 얘기가 궁금하다. 그들의 얘기를 기록으로 남겨보고 싶다. 험한 세월을 살아오면서 자신의 꿈들을 실현했다. 위대한 민중의 힘이 어떤 것이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언제 이별을 하게 될지 모른다. “인사하고 떠나는 놈 봤냐?”는 농담을 던지며 “우리 좀 더 자주 만나자”는 약속으로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세월 탓이다.